일본서기에 보이는 미상(未詳) 신라어 ‘구수니자리(久須尼自利)’의 ‘궂은 일이구나’ 해석에 대한 고찰
일본서기에 보이는 미상(未詳) 신라어 ‘구수니자리(久須尼自利)’의 ‘궂은 일이구나’ 해석에 대한 고찰
초록
『일본서기』 권19에 기록된 신라어 발화 “구수니자리(久須尼自利)”는 당시 편찬자들도 “이 신라말은 자세히 알 수 없다(未詳)”고 주석을 단 의미 불명의 표현이다. 본 연구는 이 수수께끼의 어구를 현대 한국어의 “궂은 일이구나”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그 설득력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원문 표기와 발화 상황을 검토하고, 문자 표기 방식(만엽가나식 음차)과 향찰 표기 관례에 비추어 음운 대응 및 통사 구조의 적합성을 논한다. 이어 이 해석의 맥락적 자연스러움을 당시 정황에비추어 평가하고, 기존의 다른 해석 가설들과 비교함으로써 “궂은 일이구나” 설의 상대적 신빙성을 고찰한다. 분석 결과, “궂은 일이구나”로의 해석은 해당 어구의 음운·의미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합리성을 지니며 전투 중 탄식이라는 문맥에도 비교적 부합한다. 그러나 음운 전환 과정에서 몇 가지 추정(예: *sil → 일)과 일본측 기록의 한계에 의존해야 하므로 확증에는 이르지 못한다. 결국 “구수니자리”의 정확한 의미는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함으로써 고대 신라어 해독의 어려움과 향후 연구 과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1. 서론
『일본서기』는 720년에 편찬된 일본의 정사로서, 고대 한일 관계사 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긴메이 천황 23년(서기 562년)조에는 신라 장군이 전장에서 내뱉은 신라어 한 마디가 그대로 한자로 기록되어 전한다. 그 구절이 바로 “久須尼自利”로 표기된 “구수니자리”이다. 『일본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야마토 군대는 내부 분열과 지휘관 사이의 반목으로 인해 전열이 와해되고 군사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혼란에 빠진다. 야먀토 장수 테히코(手彦)가 성의 해자(垓)에 말을 타고 뛰어넘어 간신히 도망쳤다. 그를 추격하던 신라의 장군은 성(城)의 해자 가에 서서 이 광경, 즉 적군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도하고 “구수니자리”라고 탄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의 편찬자는 이 발화가 신라어임을 인지하고 “이는 신라의 말로, 뜻은 상세하지 않다(此新羅語、未詳也)”라는 주석을 달아 두었다. 이후 현재까지 “구수니자리”는 해독되지 않은 의미 불명의 신라어로 남아 있으며,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신라어 구어(口語) 자료로서 언어사적 흥미를 끌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구수니자리”를 현대 한국어의 “궂은 일이구나”로 풀이해보는 가설을 중심으로, 그 언어학적 타당성과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궂은 일이구나”란 현대어로 “참로 안 좋은 일로구나” 즉 “나쁜 일이로다” 정도의 감탄적 표현으로서, 상황에 대한 유감이나 탄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석은 “구수니자리”의 발화 맥락(적장이 달아난 상황에서의 탄식)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의미 추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운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이 한자 표기와 현대 한국어 구문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제기된 다른 해석 가설 – 이를테면 Kōno Rokurō 등의 “니(尼)를 ‘가다’의 뜻으로 보아 ‘… 가라’는 구문으로 해석”하는 견해나, 최근 제기된 “굿 내 실”로 분절하는 시도 등 – 와 비교하여, “궂은 일이구나”설의 상대적 설득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먼저 원문 표기의 형태 및 그 음차 표기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궂은 일이구나” 해석의 음운 대응 관계와 통사 구조 적합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발화 맥락에서 이 해석이 갖는 자연스러움과 한계점을 짚어보고, 기존 해석들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구수니자리” 해독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언한다.
2. “구수니자리”의 표기와 “궂은 일이구나” 해석의 언어학적 고찰
2.1 원문 표기 방식: 만엽가나식 음차와 향찰과의 비교
“구수니자리”는 한자 “久須尼自利” 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한자의 뜻과 무관하게 음가만을 빌려 적은 만엽가나식 표기로 해석된다. 만엽가나(万葉仮名)란 고대 일본에서 『만엽집』 등의 가나 표기에 사용된 방법으로, 한자의 음(음독)을 빌려 일본어나 외국어의 소리를 표기한 것이다. 즉 “久”는 ku, “須”는 su, “尼”는 ni, “自”는 ji, “利”는 ri의 음으로 읽혀 쿠-수-니-지-리(일본식 발음으로 쿠스니지리)에 대응한다. 실제 일본서기 해당 구절의 훈독음은 “クスニジリ”로 전해지며, 이는 한자음 표기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 이러한 음차 표기는 한국의 향찰(鄕札)과 그 원리는 유사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향찰은 신라에서 향가 등을 표기할 때 한자 음과 훈을 혼용하여 한국어를 적던 방식으로, 문법 요소나 토씨는 주로 한자의 훈(뜻)을 빌려 표기하고 실질어휘는 음을 빌렸다. 반면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신라어 “久須尼自利”는 일본 편찬자가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순전히 음가로만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향찰에서는 한국어의 문법 구조에 따라 한자를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신라어의 의미 파악이 불가능하여 전부 발음 나는 대로 차용한 만엽가나식 표기가 된 것이다.
이런 표기 방식의 특징은 자음 종성 표기의 불완전성이다. 고대 한국어(신라어)에 존재하는 음운이 일본측 표기에 완벽히 대응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받침 ㄷ/ㅅ 소리는 일본어에는 없어, 보통 모음추가 등을 통해 근사치로 적었다. 또한 받침 ㄴ이나 ㄹ 소리도 일본어에서는 어말에 잘 오지 않아 구별이 어려웠다. 따라서 “久須尼自利”라는 5개 음절 표기가 실제 신라어 음절 수와 일치하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이는 이후 “궂은 일이구나” 해석의 음운 대응을 논할 때 중요한 고려점이다.
2.2 음운적 대응과 해석: “구수니자리” vs “궂은 일이구나”
“궂은 일이구나”로 해석할 경우, 해당 어구를 현대 한국어 음운으로 분석하면 [kuʣɨn ili guna] 정도로 소리난다. 이를 편의상 음절 단위로 나누면 “궂-은 / 일-이 / 구-나” (5개 음절)이다. 이제 일본서기의 쿠-수-니-지-리(kusunijiri) 표기와 하나씩 대응시켜 보겠다.
-
“久須”(쿠수) – 첫 두 글자는 “쿠수”로 읽히며, 해석안 “궂은”의 음과 견줄 때 “궂-”(kut)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궂다” 의 Middle Korean형은 kwúz-ta로 재구성되며, 관형형 “궂은” 은 [kwúz-ún]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서 끝소리 /-z/ (현대어의 ㅈ 받침에 해당, 실질적으로 [t]로 실현됨)가 일본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쿠” (ku) 모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즉 kwutun 내지 kuzun 소리를 일본인은 kusu로 듣고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본어가 당시 폐음절을 갖지 않아 종성 자음을 모음과 함께 인식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kw- 계열의 성문음이 k-(쿠)로 단순화되었을 수 있다. “久須”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구수(古音: 쿠슈)인데, 이것이 “굿/궂” 에 대응한다는 해석은 이미 일부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예컨대 安岡孝一(Yasuoka, 2024)은 “久須”를 한국어 “굿” 에 해당한다고 보고, 뒤 “自利”를 “실” 로 읽는 가설을 언급한다. 여기서 굿은 현대어로 샤머니즘 의식 굿과 동형이나, 본 문맥에서는 *“굳/궂” *의 음과 일치하는 점이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久須”(쿠수) ≈ “궂(굳)” 이라는 음운 대응은 성립 가능한 범주로 판단된다.
-
“尼”(니) – 세 번째 글자 “尼”는 일본어 음으로 니(ni)이다. “궂은 일이구나”에서 “일”의 첫소리 [i]가 자음 없이 모음으로 시작되는데, 일본인은 이 모음을 앞의 받침과 연쇄하여 [ni]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kuzun il… 연쇄에서 /n/ + /i/가 [ni] 로 청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다른 접근이 있다. Kōno(1987)는 “尼”를 니 로 읽고 이를 고대 한국어 동사 니(나가다, 가다) 로 해석하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견해대로라면 “久須尼自利”는 “굳-니-자리”로 분절되어 “굳(…) 가 (….)” 의 구조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自利”의 해독이 난망해지므로, Kōno 설은 구체적 번역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남겼다. 본고에서는 보다 단순하게, “尼”를 이전 음절의 종성 /n/이 딸린 음으로 파악하여 “니” ≈ 받침 “ㄴ” + 모음 이로 보겠다. 다시 말해 “궂은 일”에서 “은(il)” 부분의 ㄴ + ㅣ 소리가 독립 음절처럼 전달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 가정이 옳다면 “尼”는 “일이”의 일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自利”와 함께 고려).
-
“自利”(자리) –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 “자リ”는 자리(jari)로 읽힌다. 겉으로 보면 한국어 “자리”와 같은 음상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유어 “일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즉 “일이구나” 의 “이구나” 부분이 자리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음운적으로 살펴보면, “일이구나”를 빠르게 발음할 때 [iliguna]인데, 일본인은 [i…guna]에서 모음 [i] 뒤에 오는 [g]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dʑ]에 가까운 소리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일본어에는 어두 자음군 [gw]/[kw] 등이 존재했지만, 외국어의 유성음 [g]를 [ʣ] 소리로 혼동했을 수 있다. “自”를 자(ジャ) 로 읽은 것은 이런 혼동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한편 “利”는 분명히 리(リ)로서 종결 모음 -na를 전혀 닮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음운 대응의 난점인데, 몇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첫째, 구나의 -na가 [nɐ] 소리로 들렸을 경우, 일본인이 이를 [ri]로 잘못 듣거나 기록 과정에서 혼동했을 수 있다. 그러나 [na]를 [ri]로 착각하는 것은 음성적 유사성이 낮아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가정으로, “자리” 전체가 한 음절의 복잡한 종성 포함음을 나타낸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실” 이나 “일” 같은 음절을 일본식으로 표기하려고 二字로 나누어 적는 경우가 고려된다. 실제로 安岡(2024)은 “自利”를 “糸利” 즉 한국어 “실”을 만엽가나로 적은 표기라고 해석하였다. ‘실’은 현대 한국어에서 “실” (실, thread)의 음이지만 여기서는 일(事)의 고대 형태로 상정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일” (일, 사건/일)의 어원이 sil 혹은 sirh로 추정되기도 한다. 만일 신라어 시기에 ‘일(事)’을 “실” 비슷하게 발음했다면, 自(자) 와 利(리) 를 조합하여 [sil] 소리를 표현하려 했던 것일 수 있다. “糸” 변이체로서 “自”를 쓰고 “利”를 더한 표기가 그런 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가설을 따르면, “久須尼自利”는 “굿 내 실”로 분해되어 “굿내 실”, 곧 “내 실(일)” 이라는 구문이 된다. 다만 ‘내(my)’라는 1인칭 소유대명사를 쓴 점 등 통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맥락상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상황을 탄식하는 것인 바 “내 일” 보다는 “이 일(사건)”이 와야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자리”를 “실(일)” 로 읽는 시도는 음운사적으로 흥미롭지만, “구수 니자리” 전체를 해석하는 데 명확한 문맥을 주지는 못한다.
이상의 음운 분석을 종합하면, “구수니자리”를 “궂은 일이구나”로 대응시키는 것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궂은” 의 끝 자음 -ㄷ(ㅈ) 소실 및 “일” 의 고대형 sil 가정을 통해 “久須”=궂, “自利”=일 의 음가 대응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尼”를 앞뒤 음절의 연결음 (ㄴ+ㅣ)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하면 음운적으로 전체 구조가 대체로 들어맞게 된다. 실제로 “구수니자리”를 한국식으로 음절구분하면 구-수-니-자-리이고, 여기에 대응하여 “궂-은-일-이-구나”를 늘어놓으면 상당 부분 유사한 자음과 모음 배열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kusu-ni- vs kut-un i- 사이, -jari vs -guna 사이의 간격은 엄밀히 따지면 완벽하지 않으나, 기록자의 청취 착오나 표기 한계 내에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 본 해석의 출발점이다.
2.3 통사적 구조와 의미 맥락의 적합성
“궂은 일이구나”라는 한국어 문장을 통사적으로 보면, [주어 생략] + [궂은 일] (명사구) + [이구나] (서술어) 의 구조이다. 즉 화자는 어떤 사태를 가리켜 “(이것은) 궂은 일(나쁜 일) 이구나!” 하고 감탄(혹은 탄식)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구나” 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새삼스럽게 깨달았을 때의 감탄형 종결어미로 쓰이며, 독백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궂은 일이구나”는 화자가 눈앞의 상황을 두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어법에 부합한다. 이것을 6세기 신라어 화자의 실제 발화로 상정하면, 그 문법 체계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감탄표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8세기 향가 등에도 감탄형 종결구가 나타나며, 중세국어에는 “-구나/-구나ᄂᆞ” 등의 형태가 쓰인 바 있다.
한편 “久須尼自利” 표기는 한자로 연속된 어구 전체를 묶어놓았기에 내부 문법 구조를 직접 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음운 분석을 통해 “…尼…自利” 부분을 하나의 구(句)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Kōno는 이를 동사구로 보았으나, 본고는 명사구+서술어구 (궂은 일 + 이구나)로 보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신라어가 한국어 계통이었다면 형용사 + 명사 + 서술격 조성의 통사 구조가 통용되었으리라는 점이다. 현대 한국어 “나쁜 일이다”에 상응하는 어형이 고대에도 존재했을 것이며, 다만 그 형태표지가 지금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중세 국어에서 서술격 조사는 “–이–” 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 “–이라/–이라우/–이로다” 등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향찰 표기에 따르면 왕을 찬양하는 향가 「찬기파랑가」(嘉耶郎歌)에서 “-伊勒迦”(…이루가) 형태가 나오는데, 이는 “…이로구나”의 감탄형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와 비교할 때, “-구나” 에 해당하는 신라어 표현이 실제로 “-尼自利” 등으로 적힐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다. “尼” 한 글자가 조동사나 어미를 나타내는 향찰 사례도 있지만, 여기서는 음차이므로 “-구나” 전체를 “…尼自利” 두 글자로 분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결론적으로 통사 구조 면에서 “궂은 일이구나” 가설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어색한 점 없이, 오히려 해당 맥락의 화용(話用)에 잘 부합한다. 투장(장수)이 적의 어이없는 자멸을 보며 허탈함, 안타까움, 혹은 냉소적인 만족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혼잣말로 “아, 이것 참 궂은(언짢은) 일이로군” 하고 한탄했다고 본다면 맥락적으로 우아하다. 이는 “구수니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때와 비교해도 맥락 적합성이 높은 편이다. 예컨대 이를 어떤 욕설이나 저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본서기 본문 어디에도 그런 취지의 주석이나 번역이 없으며 오히려 “탄식하였다(歎曰)”라는 서술로 미루어 부정적 감탄의 뉘앙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궂은 일이구나”는 내용상으로도 해당 탄식의 성격을 가장 잘 살린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기존 해석 가설들과의 비교 및 비판적 검토
“구수니자리”의 의미를 밝히려는 시도는 과거부터 몇 가지 있었으나,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표적인 견해들을 살펴보고 “궂은 일이구나” 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ōno Rokurō(河野六郎) 의 가설이다. 그는 백제어 연구의 일환으로 신라어 “久須尼自利”에 주목하여, “尼”를 신라어 동사 ‘니(가다)’로 읽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의 해석을 따르면, 전체 구절은 “굿 + (동사)니 + 자리”로 나뉘며 “… 가 (….)”의 형태가 된다. Kōno는 “자리” 부분의 의미를 확정짓지 않은 채로 논지를 전개했는데, 만약 “자리”를 현대어 “자리(座)”처럼 해석하면 “굿[궂] 가 자리” = “(네가) 가라, 제 자리로” 정도의 명령형 문장이 될 여지가 있다. 즉 도망치는 적장에게 “당장 네 자리로 돌아가라” 혹은 “제자리에서 꼼짝 마라” 같은 뜻의 호통이나 저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Kōno 자신도 확언하지 않았다. 통사적으로도 한 문장 안에 명령형 동사가 들어가게 되어 앞뒤 맥락(탄식)과 조화롭지 않다. 또한 “자리”를 ‘제 자리’로 보는 것은 현대적 발상이며, 고대 국어에서 “자리”가 오늘날처럼 ‘장소’ 의미를 가졌는지도 불확실하다. 오히려 “자리”는 현대어에서 왼뼉친 친숙한 고유어지만, 삼국시대 기록에 분명한 용례가 없다. 따라서 Kōno의 설은 음운 해석의 한 가능성을 지적한 데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번역이나 의미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약한 편이다. “궂은 일이구나” 설에 비해 맥락 상 자연스럽지 않고, 문장 구성도 복잡해진다.
둘째, 安岡孝一(Yasuoka) 의 해석 실험이다. 그는 2024년 기고문에서 “久須尼自利”를 “굿 내 실” 로 분해하여, 이를 Universal Dependencies 형태로 분석해 보였다. 그의 안은 “굿(명사) + 내(대명사의 속격) + 실(명사)”이라는 구조로, 직역하면 “내 실(굿)” 정도가 된다. 여기서 굿은 ‘궂’과 동음이의이지만 의미는 무속의식 굿, 실은 ‘일(事)’의 가상어원으로서 앞서 살핀 바와 같다. Yasuoka는 이 분석이 하나의 가능성 실험임을 밝히며, 특히 “내” (나의) 가 정말 신라어에서도 “내”였는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굿 내 실” 은 통사적으로 “내 나쁜 일” 또는 “나의 굿(의식)” 등 모호한 해석이 되고 만다. 전자는 내가 당한 궂은 일이라는 자기연민처럼 들려 맥락에 맞지 않고, 후자는 상황과 동떨어진다. 안타깝지만 Yasuoka의 시도는 음운적인 대응 가능성을 탐색한 것일 뿐, 완전한 문장의 뜻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다만 그의 분석 과정에서 “自利” = “실” 가정이나 Kōno 설 인용 등은 본고의 음운 논의에도 참조가 되었다. “궂은 일이구나” 설은 Yasuoka안과 비교할 때, 내와 같은 추가 가정 없이 바로 눈앞의 상황을 평탄하게 묘사하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맥락 적합성과 명료성에서 우위에 있다.
셋째, 기타 설로 “욕설 또는 탄식” 막연히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일본서기 해당 부분에 대한 현대 일본어 번역서나 주해를 보면, “久須尼自利”를 뜻을 모르는 감탄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탄식하며 말하였다”는 기술에 근거해 “아아” 정도의 감탄사로 보거나, 혹은 신라인이 패주하는 왜장을 보고 조롱하거나 저주하는 투로 중얼거렸을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역사 포럼 등에서는 “죽었구나”, “망했다”, “잡았다” 등 여러 억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어원적 근거가 빈약하다. “죽었다”에 해당하는 신라어로서 “주글” 등이 검토되기도 하나 “구수니자리”와 음운상 거리가 멀다. 결국 학계에서 공인된 해석은 아직 없으며, 국내 번역서에서도 “구수니자리(미상)”로 그대로 남겨둔다. 이런 상황에서 “궂은 일이구나” 설은 비교적 구체적인 어휘 대응과 문장 형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완벽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욕설설처럼 막연하지 않고 신라어 어휘 “궂다”, “일”의 존재 가능성에 기대어 설득력 있게 설명을 시도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이것이 신라어가 아니라, 신라 장군이 외친 일본어 욕설이라는 주장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신라 장군은 잦은 군사적 접촉 등으로 일본어에 익숙했을 수 있으며, 적의 자멸을 보며 “糞飲みしろ(쿠소노미시로, ‘똥이나 처먹어라’는 의미의 거친 욕설)” 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久須尼自利’의 기록된 음가와 목표 어구 사이에는 놀라운 음운적 유사성이 있다. Ku-su-ni-ji-ri (久須尼自利)와 Kus(o)-n(om)i-s(h)iro (糞飲みしろ)를 비교하면, ’久須尼’(쿠수니)는 ‘쿠소니’와 거의 일치하며, ‘自利’(지리)는 ‘시로’에 대한 매우 그럴듯한 음차로 볼 수 있다. 고대 일본어에서 ‘s’와 ‘j’ 사이의 음운 변이는 흔하며, ‘ri’와 ‘ro’의 혼동 역시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있다. 군 지휘관이 적군의 붕괴를 보며 조롱과 경멸이 담긴 거친 욕설을 내뱉는 것은 전쟁 상황의 원초적인 감정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이다. 이는 고상한 탄식보다 오히려 더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주장은 많은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신라 장군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과 당대 일본인의 오인이라는 별도의 가정이 필요하다.
요컨대, “궂은 일이구나”로의 해석은 현재까지 제안된 가설들 가운데 맥락적 개연성과 언어내적 개연성이 모두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이 해석의 강점은 (1) 전후 사정에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감탄형 문장을 제공하며, (2) 현대 한국어로 의미 파악이 명료하다는 점이다. 또한 (3) 궂다, 일 등 실제 존재하는 한국어 어휘를 기반으로 하므로 허무맹랑한 조어 추측이 아닌 점도 신빙성을 높인다. 반면 이 해석의 약점이나 한계로는, 음운 대응에 몇 가지 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 “구나” -> “자리”의 대응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guna” 가 “-jari” 로 표기된 이유에 대해, 현시점의 음운사 지식으로는 추정밖에 할 수 없다. 6세기 신라어 발음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없으므로, “구수니자리” 음차 표기의 정확한 발음값을 역추적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일(事)”의 고대음이 실이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해도 일본인이 그 s음을 인지했을지 의문이다. 기록자의 실수나 오자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久須尼自利” 중 한 글자만 잘못 전달되었어도 해독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尼’가 사실은 다른 음의 한자였는데 필사 과정에서 변화되었을 가능성 등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궂은 일이구나” 설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완전히 입증하거나 반증할 증거는 부족하다.
4. 결론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신라어 직설구인 “구수니자리(久須尼自利)”는 그 뜻이 분명치 않아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의문의 어구를 현대 한국어 “궂은 일이구나” 로 해석하는 가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원문 표기의 만엽가나식 음차 특성과 신라어의 음운 체계를 고려한 분석을 통해, “궂은 일이구나”로의 해독이 일정 부분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久須”는 “궂(굳)” *에 대응하고, “自利”는 *“일(실)” 에 대응한다는 해석은 음운사적 가정을 필요로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다. 또한 통사적으로 볼 때 해당 문장은 감탄형 서술문으로 전장의 탄식 상황에 잘 부합하며, 의미상으로도 “안 좋은 일로구나” 라는 뉘앙스는 패장을 놓친 신라 장수의 심정을 그럴듯하게 대변한다.
그러나 본 가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 “구수니자리”의 정확한 음과 뜻을 해명하려면, 신라어에 대한 추가 자료나 교차 증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동시대 향가나 지명, 인명 등의 단편적인 자료밖에 없다. 일부 향찰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추론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추론의 영역이다. 결국 “궂은 일이구나” 설은 맥락적인 설득력이 있는 추정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구수니자리” 해독 시도가 언어학적·문헌학적으로 어떠한 쟁점을 수반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신라어를 표기한 한자 자료를 해석할 때 나타나는 음운 전환의 문제, 표기 관행의 문제, 의미 추정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고대 한국어 해독 연구에 교훈을 제공한다. 예컨대, 소리글자로 적힌 외국어의 해석에는 그 언어의 음운사뿐 아니라 기록자의 언어와 문자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궂은 일이구나”와 같이 현대 한국어와의 연속성을 가정하는 해석은 흥미롭지만, 반드시 엄밀한 음운 대응 검증을 거쳐야 함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구수니자리”의 정확한 뜻은 아직 완전히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 “궂은 일이구나”라는 해석은 현 시점에서 맥락상 개연성 높고 매력적인 가설이지만, 제한된 자료로 인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신라어 “구수니자리”는 단일 용례(hapax legomenon)라는 근본적인 한계 속에서, 어떠한 해석도 반증 불가능한 추론의 영역에 머물 수 밖에 없다. 향후에 더 많은 관련 문헌 자료의 발견이나, 음운 비교 연구의 진전이 있다면 이 수수께끼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본 연구와 같이 가능한 가설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상호 비교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신라어 “구수니자리”에 담긴 고대인의 한숨을 완전히 이해하는 일은 어려울지라도, 이를 추적하는 과정 자체가 한국어 통시적 연구의 한 페이지를 풍부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종복 (역주). (2018). 완역 일본서기. 서울: 지만지. (원전: 日本書紀, 720).
- 国史大系編修会 (編). (1965). 日本書紀. 東京: 吉川弘文館. (원문 및 주석본)
- 安岡孝一. (2024). 「久須尼自利」は「굿 내 실」なのか. Qiita 웹사이트 기고
- 河野六郎. (1987). 百済語の二重言語性. 朝鮮の古文化論攷. 東京: 同成社, pp.81-94.
- Park, I. (2020, 9. 1). 830년 일본의 신라 침공 계획 (블로그 게시글). Interesting Story Storage. (2023.08.15 접속)
- Wikisource 일본서기 권19 원문 및 현대한역(川辺臣手彦 조). (2023.08.15 접속)
이 논문은 ChatGPT, Gemin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EOD
20250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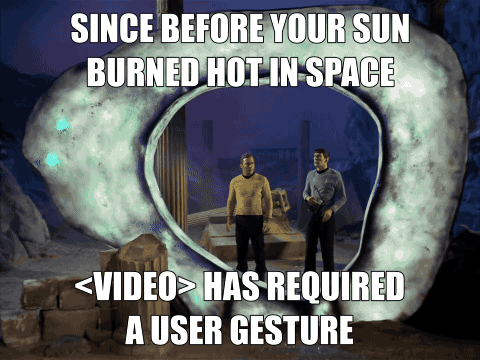

Leave a comment